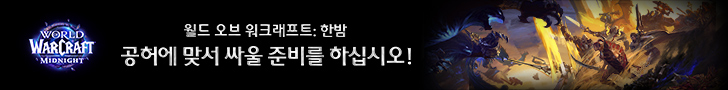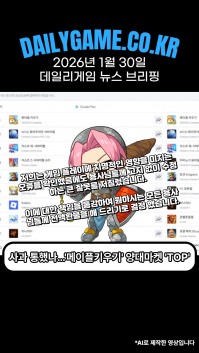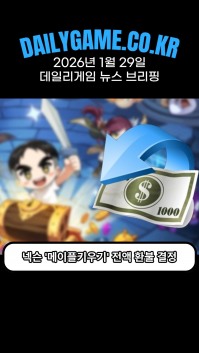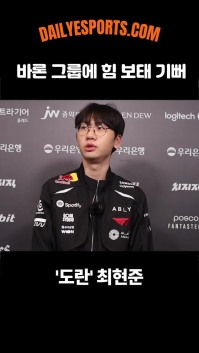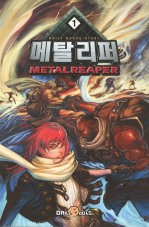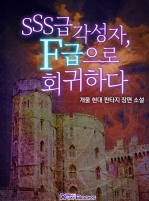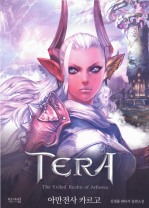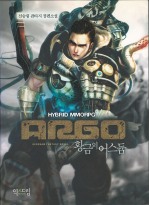데이터를 살펴보면 징크스와 아펠리오스의 차이는 더욱 확실해진다. 총 3번의 LCK 팀과 LPL 팀 간 대전(T1 대 JDG, 젠지 대 BLG, T1 대 BLG)에서 LCK는 단 한 번도 아펠리오스로 징크스를 이기지 못했다. 아펠리오스 대 징크스 구도는 총 6번 등장했고, 징크스가 유일하게 패배했던 경기는 '구마유시' 이민형이 징크스를 잡고 패했던 T1과 JDG의 4세트 경기였다. LCK 팀은 LPL 팀과 경기한 12세트 중 5세트를 아펠리오스를 잡고 징크스를 상대로 패했다.
징크스가 이번 MSI 메타에서 '사기적인' 성능을 자랑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우월한 사거리와 터지기만 하면 압도적인 성능의 패시브의 조합으로 딜을 가장 잘 우겨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후반에 가기만 하면 징크스만한 성능을 가진 원거리 딜러가 없었다. 그런 만큼 징크스는 원거리 딜러 중 가장 높은 밴픽율을 기록했고, 특히 그 중요성이 대회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강조됐다. 단순히 징크스 픽 뿐 아니라 다른 픽들 역시 징크스와의 관계에 따라 성능이 변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미드 챔피언 중 1티어에 해당했던 애니는 긴 사거리를 가진 징크스를 상대로는 무기력한 모습이 자주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젠지와 BLG의 2,3 세트다. 반대로 애니와 징크스가 함께 활용될 때는 애니의 CC기에 징크스 궁극기를 연계하면서 '신난다'를 터뜨리기 쉽다는 이유로 두 챔피언 모두가 웃는 구도가 나오기도 했다.
원거리 딜러를 키워서 캐리시키는 게임으로 요약될 수 있었던 MSI의 메타에서, 캐리 역할을 맡는 원거리 딜러 픽은 단순히 픽 하나가 아니라 팀의 콘셉트를 결정하는 요소였다. 그것이 바텀의 티어 정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았던 원인이다. 징크스를 상대로 아펠리오스를 고른 팀은 결국 후반 딜 포텐셜이 밀리는 상태로 게임에 진입해야 했고, 소위 말하는 폭탄 목걸이를 달고 게임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선수 개개인의 플레이가 물론 더욱 중요한 요소지만, 심리적으로 몰리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는 밴픽 역시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물론 티어정리에 실패한 것만이 이번 MSI에서의 실패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다양한 플레이에서의 실수가 모인 결과에 더 가깝다. 또 밴픽의 실패가 단순히 감독 이하 코치진의 잘못으로 지목되고 그로 인해 그들이 과도하게 비판 받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패자 인터뷰에서 매번 티어 정리라는 단어가 등장한 만큼, 이 부분을 빼고 MSI의 결과를 해석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다음 국제무대에선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OP 챔피언을 발빠르개 캐치해 티어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밴픽에 나서는 LCK 팀이 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허탁 수습기자 (taylor@dailyesports.com)